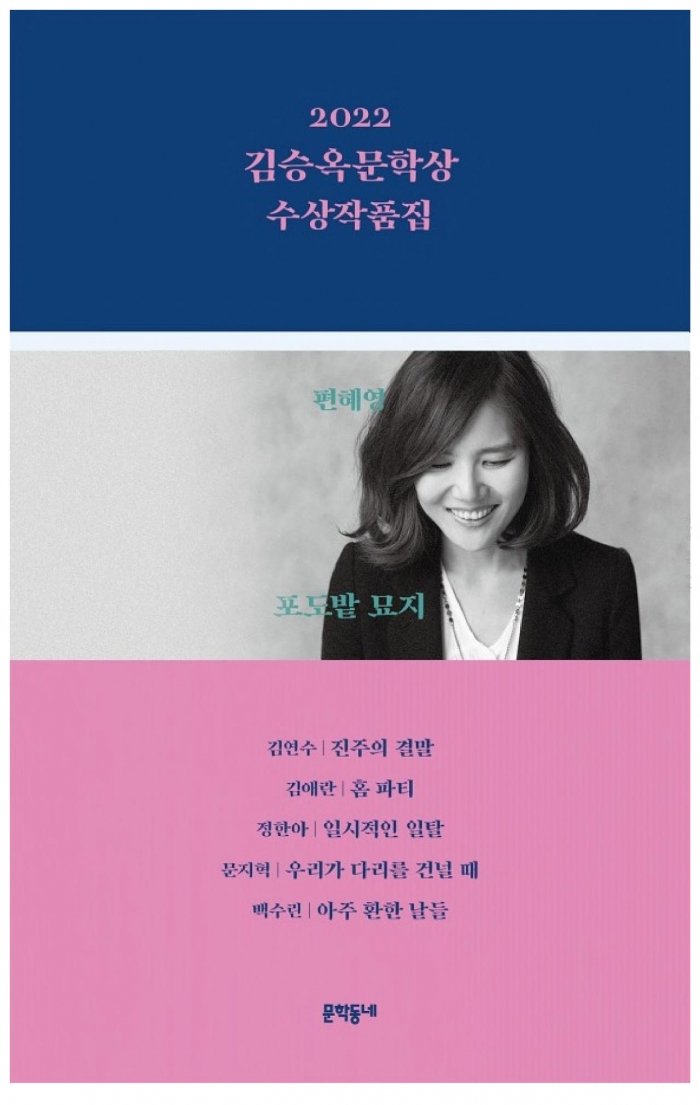그 사람에게 친절히 보였을까. 말실수를 하지는 않았을까. 우리는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스스로 검사하곤 한다. 가족은 거의 모든 검사에서 자유로운 사이다. 대부분 가족을 가장 편한 사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편했기에 서로에게 무신경했고 말투는 무뚝뚝하게 변해갔다.
책의 주인공 ‘옥미’도 그렇다. 그녀의 남편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유일한 가족인 딸과는 왕래가 거의 없는 편이다. 생각해보면 멀어질 만한 이유는 충분했다. 옥미는 딸이 키우던 닭을 허락 없이 다른 곳으로 보냈고 딸에게 피곤하다는 이유로 짜증을 내기도 했다. 결혼 후 거의 연락이 끊겨버린 딸과 일주일에 한 번 간단한 안부를 주고 받지만 그마저도 거는 쪽은 옥미다. 옥미의 입장에서는 생계를 위해 빠듯하게 살았을 뿐인데 딸에게 상처를 주게 됐다. 그녀는 딸에게 섭섭함을 느낀다. 엄마에게 상처를 받기 전 무조건적으로 주었던 딸의 사랑을 여전히 바라는 것이다.
옥미는 앵무새와의 만남 이후 변화한다. 그녀는 딸에게 그랬던 것처럼 앵무새가 소리 지를 때마다 텔레비전의 볼륨을 높이고 무시했다. 결국 앵무새는 스스로 털을 뽑아 엉망이 됐다. 병원에서는 앵무새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진단을 내리고 그녀는 앵무새를 통해 자신의 행동이 딸에게 상처였다는 걸 깨닫는다. 옥미는 앵무새를 삶에 들이며 진심으로 가족을 대하는 방법을 배운다. 옥미에게 앵무새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딸에게 한 자기 행동이 상처였다는 사실을 평생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잘못을 자각시켜줄 앵무새는 찾아오지 않는다. 평생을 자신의 방식이 잘못된 지 모른 채 가족을 대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가족은 모든 걸 이해해줄 거라는 생각에 행동의 검사 없이 넘어가고는 한다. 이런 가족은 주위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내면에 자신만의 앵무새를 키워야 한다. 자리에 앉아 앵무새를 기다리는 건 너무 늦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앵무새가 돼야 한다. 많은 이들이 허물없다는 말을 앞세워 함부로 가족을 대한다. 그 과정에서 쌓인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이미 상처를 줬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깨달았다면 관계 개선의 여지는 있다. 애초에 완벽한 가족은 없다. 다만 끊임없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하는 미완성의 가족만이 존재할 뿐이다. 가족에게 친절히 보였을까. 말실수를 하지는 않았을까. 우리는 가족과 함께하며 스스로를 검사해야 한다.